기울어지면, 안아줄 수 있잖아
박수정
현관을 지나[1] 거실에 이른 이야기
사적인 공간인 집이 주는 감정과 경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신발 밑창의 단단함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삼은 채,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땅을 밟다 보면 발에 오르는 열감이 느껴진다. 고단한 하루를 데운 모든 목적지에 다다르고 떠나기를 반복한 뒤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 둔탁한 발소리 대신 발바닥으로 걷는, 나의 집. 집은 목적지라 불리지 않는다. 집을 의미하는 한자 室(실)을 이루는 부수 글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宀(면)은 ‘집’을 의미하며 至(지)는 ‘~에 이르다’는 뜻을 지닌다. 집은 내가 다시금 돌아가는, 내가 이르는 곳이다. 집에 이르러 보이는 거실은 공동의 공간이자 구성원의 취향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거실에서 공동의 기억을 품는다. 성장 과정, 함께 다녀온 여행지에서의 추억, 그리고 지금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지 않은 자들이 눈에 들어온다.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나무가족》는 작가가 지극히 사적인 거실에서 나누고 싶어 했던 시간, 그중에서도 가장 작게 들리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이르는 곳으로서 거실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작가가 항상 이야기해 온 근원과 가족에 대한 발걸음과 닿는다. 호크마김은 여기에서부터 나무를 마주하고 색을 바라보고 자신을 대한다. 세상을 대하는 작가의 방식과 닮은 곳으로서 이 전시장은 그의 그림을 지극히 품는다.
기울어진 채로 너의 옆모습을 보며
“휘어져 자란 이 나무는 자라나고 살아갈 때 자신의 옆모습을 인지하나요?”
“나무는 위, 아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깃발 형태의 가지 모양을 보이는 종들은
바람이 거센 곳, 고산지대와 같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종들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은 아예 이와 같은 환경에 깃발 형태로조차 존재하지 못합니다.”[2]
호크마김은 회화를 통해 가장 나무를 나무답게 바라보는 법을 탐구해 왔다. 그는 지금까지 나무들의 앞에 서 있었다. 배접한 장지 혹은 구겨서 주름을 만든 장지를 덧대어 바른 합판 위에 배경이 된 밑 색과 질감이 오르고, 그 위에 다시 나무 가족들의 형상이 거듭하여 쌓였다. 가장 연약한 나무는 가족 중에서도 맨 위에 올랐고 그 존재의 앞에 선 작가 그리고 나무들이 올라선 토대인 회화는 가운데 모인 이들을 힘껏 안았다. 호크마김과 작품이 나무를 안고 있는 그의 회화적 포옹은 둥글고 단단한 힘이 되어 서로의 시간을 지켜왔다. 이번 전시에서 호크마김은 지금까지 아래에서 위로 겹겹이 오르는 나무의 성장 방식을 따르던 것에서 좀 더 나아간다. 휘어져 자라기로 결심한 <유독>의 나무는 자신의 존재에게 불어오는 바람 - 다성적(polyphony) 고통에 함몰되지 않으며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고 그곳을 지킨다. 나무를 가장 자신답게 바라볼 수 있는 작가만의 새로운 자리는 바로 나무들의 ‘옆자리’이다. 그들의 옆에 선 작가는 지금까지 앞에서는 볼 수 없던 나무의 옆모습을 그리기 시작했고 작가와 작품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공간인 ‘초록의 품’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초록의 색 면과 나무 형상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 드러난다.
호크마김은 나무의 옆모습을 회화로 꼭 안기 위해 자신을 기울인다. 기울어진 작가와 회화 속 나무들 사이에서 생긴 ‘초록의 품’은 배경의 색 면과 형상의 레이어로서 서로에게 속하고 겹치며 앞과 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기울임의 거리는 매번 달라지는데, 작가는 작품 속에서 축소와 확대의 감각을 적용함으로써 작가적 탐구의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고 다시 나무 옆에 이르며 손끝이 겨우 닿을 만큼 멀어졌다가, 다시 서로 꼭 안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다. <울타리>에서는 손끝에 닿는, 멀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무의 형상에 집중하는데, 이는 나무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의미화해 나가는 과정을 연결 지어 온 작가의 구상적 여정이다. 이와 반대로 <확대경>은 초록의 품에서 가장 가까운 것, 즉 나무의 색과 질감이 만져지는 순간을 포착한다. 이는 초록이라는 색의 세계에 끊임없이 다가가 만지고 맛보며 구상과의 필연성을 찾아 연결 짓고자 하는 작가적 탐구의 흔적이다.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는 거리감의 변화를 통해 회화 속 레이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형상과 색 사이의 지각적 접촉은 <초록의 어두운 부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의 생을 안아주는 초록의 품
전시장의 또 다른 공간에 들어서기 전, <모모>, <파파>, <조조>의 시선을 따라 너머를 바라보면 침실 같은 내부가 보인다. 이곳은 앞서 작가가 나무를 향해 기울인 옆모습이 좀 더 견고한 단계의 초록의 품에 작가의 옆모습이 겹치는 과정을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깊이에서 보여준다. 여기에서 작가의 옆모습은 그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대하는 모양이며, 동시에 작가로서의 성장과 회복이 드러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시의 관람객이자 거실에 초대된 우리는 이제 나무의 옆 그리고 작가의 옆에 나란히 앉게 된다. <자각몽 [自覺夢]>과 이를 둘러싼 이불에 누워 있는 작품들의 연출적인 구성은 호크마김과 김수홍 작가가 함께 만든 동화 <푸른 나무 위 하얀>속에서 묘사한 “겨울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라는 뾰족한 마음”과도 같이 까끌거리며 짙게 번지며 이어지는 연속된 검정의 <죽음>의 시간에서 되돌아온 순간을 드러낸다.
“상흔처럼 남은 눈이 서서히 녹고, 푸른 잎이 되돌아오는” 때가 다가올 때 그 옆을 지킨 것은 초록이다. 서서히 녹는 눈의 느리고 시린 시간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따뜻함을 나눠 주어야 한다. 아주 가까이에서, 어디에서부터 서로가 분리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생[生]으로 차오른 록[綠]>에서 작가는 지금껏 곁을 내어준 초록을 한데 모아 자신의 바로 옆에 두기를 시도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초록은 나무 그 자체로서 작가를 위로했고, 춤을 추듯 바람에 살랑거리며 사랑을 노래하는 나무의 움직임으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으며, 나무가 되기 위해 단단한 땅의 시간을 견디며 때를 기다리는 씨앗의 용기를 전해주었다. 연두와 청록, 올리브와 라임 등 다양한 초록이 흐릿한 경계를 두고 여기에 모였다. 그리고 작가는 그 초록의 품에 온전히 안겨 있다. 하얀 눈이 녹고 완연한 봄이 오는 날, 이 나무에는 어떤 초록이 돋아날까? 지금 이 순간, 내 옆의 초록들을 한껏 들이마시며 기울어지며 상상해 본다.
-
[1]본 서문은 2024년에 열렸던 호크마김의 또 다른 전시 《From the Shack, New Sprouts Come.》을 위해 작성했던 서문 <기억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와 지금 내 뒤의 고스란한 나무는 어떻게 포개지는가>를 마무리 지으며 이야기했던 현관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이어진다.
[2]이번 전시의 작품들 속에서 작가를 상징하며 등장하는, 기울어진 채 여러 기둥이 모인 나무 형상의 기원이 된 실제 나무 사진을 보며, 바람에 휘어진 나무는 어떻게 성장하며 자신의 방향을 인지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의 문의란에 이에 대한 질문을 남겼고, 받은 답변을 위에 요약하여 담았다.
사적인 공간인 집이 주는 감정과 경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신발 밑창의 단단함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삼은 채,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땅을 밟다 보면 발에 오르는 열감이 느껴진다. 고단한 하루를 데운 모든 목적지에 다다르고 떠나기를 반복한 뒤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 둔탁한 발소리 대신 발바닥으로 걷는, 나의 집. 집은 목적지라 불리지 않는다. 집을 의미하는 한자 室(실)을 이루는 부수 글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宀(면)은 ‘집’을 의미하며 至(지)는 ‘~에 이르다’는 뜻을 지닌다. 집은 내가 다시금 돌아가는, 내가 이르는 곳이다. 집에 이르러 보이는 거실은 공동의 공간이자 구성원의 취향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거실에서 공동의 기억을 품는다. 성장 과정, 함께 다녀온 여행지에서의 추억, 그리고 지금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지 않은 자들이 눈에 들어온다.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나무가족》는 작가가 지극히 사적인 거실에서 나누고 싶어 했던 시간, 그중에서도 가장 작게 들리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이르는 곳으로서 거실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작가가 항상 이야기해 온 근원과 가족에 대한 발걸음과 닿는다. 호크마김은 여기에서부터 나무를 마주하고 색을 바라보고 자신을 대한다. 세상을 대하는 작가의 방식과 닮은 곳으로서 이 전시장은 그의 그림을 지극히 품는다.
기울어진 채로 너의 옆모습을 보며
“휘어져 자란 이 나무는 자라나고 살아갈 때 자신의 옆모습을 인지하나요?”
“나무는 위, 아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깃발 형태의 가지 모양을 보이는 종들은
바람이 거센 곳, 고산지대와 같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종들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은 아예 이와 같은 환경에 깃발 형태로조차 존재하지 못합니다.”[2]
호크마김은 회화를 통해 가장 나무를 나무답게 바라보는 법을 탐구해 왔다. 그는 지금까지 나무들의 앞에 서 있었다. 배접한 장지 혹은 구겨서 주름을 만든 장지를 덧대어 바른 합판 위에 배경이 된 밑 색과 질감이 오르고, 그 위에 다시 나무 가족들의 형상이 거듭하여 쌓였다. 가장 연약한 나무는 가족 중에서도 맨 위에 올랐고 그 존재의 앞에 선 작가 그리고 나무들이 올라선 토대인 회화는 가운데 모인 이들을 힘껏 안았다. 호크마김과 작품이 나무를 안고 있는 그의 회화적 포옹은 둥글고 단단한 힘이 되어 서로의 시간을 지켜왔다. 이번 전시에서 호크마김은 지금까지 아래에서 위로 겹겹이 오르는 나무의 성장 방식을 따르던 것에서 좀 더 나아간다. 휘어져 자라기로 결심한 <유독>의 나무는 자신의 존재에게 불어오는 바람 - 다성적(polyphony) 고통에 함몰되지 않으며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고 그곳을 지킨다. 나무를 가장 자신답게 바라볼 수 있는 작가만의 새로운 자리는 바로 나무들의 ‘옆자리’이다. 그들의 옆에 선 작가는 지금까지 앞에서는 볼 수 없던 나무의 옆모습을 그리기 시작했고 작가와 작품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공간인 ‘초록의 품’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초록의 색 면과 나무 형상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 드러난다.
호크마김은 나무의 옆모습을 회화로 꼭 안기 위해 자신을 기울인다. 기울어진 작가와 회화 속 나무들 사이에서 생긴 ‘초록의 품’은 배경의 색 면과 형상의 레이어로서 서로에게 속하고 겹치며 앞과 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기울임의 거리는 매번 달라지는데, 작가는 작품 속에서 축소와 확대의 감각을 적용함으로써 작가적 탐구의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고 다시 나무 옆에 이르며 손끝이 겨우 닿을 만큼 멀어졌다가, 다시 서로 꼭 안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다. <울타리>에서는 손끝에 닿는, 멀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무의 형상에 집중하는데, 이는 나무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의미화해 나가는 과정을 연결 지어 온 작가의 구상적 여정이다. 이와 반대로 <확대경>은 초록의 품에서 가장 가까운 것, 즉 나무의 색과 질감이 만져지는 순간을 포착한다. 이는 초록이라는 색의 세계에 끊임없이 다가가 만지고 맛보며 구상과의 필연성을 찾아 연결 짓고자 하는 작가적 탐구의 흔적이다.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는 거리감의 변화를 통해 회화 속 레이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형상과 색 사이의 지각적 접촉은 <초록의 어두운 부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의 생을 안아주는 초록의 품
전시장의 또 다른 공간에 들어서기 전, <모모>, <파파>, <조조>의 시선을 따라 너머를 바라보면 침실 같은 내부가 보인다. 이곳은 앞서 작가가 나무를 향해 기울인 옆모습이 좀 더 견고한 단계의 초록의 품에 작가의 옆모습이 겹치는 과정을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깊이에서 보여준다. 여기에서 작가의 옆모습은 그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대하는 모양이며, 동시에 작가로서의 성장과 회복이 드러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시의 관람객이자 거실에 초대된 우리는 이제 나무의 옆 그리고 작가의 옆에 나란히 앉게 된다. <자각몽 [自覺夢]>과 이를 둘러싼 이불에 누워 있는 작품들의 연출적인 구성은 호크마김과 김수홍 작가가 함께 만든 동화 <푸른 나무 위 하얀>속에서 묘사한 “겨울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라는 뾰족한 마음”과도 같이 까끌거리며 짙게 번지며 이어지는 연속된 검정의 <죽음>의 시간에서 되돌아온 순간을 드러낸다.
“상흔처럼 남은 눈이 서서히 녹고, 푸른 잎이 되돌아오는” 때가 다가올 때 그 옆을 지킨 것은 초록이다. 서서히 녹는 눈의 느리고 시린 시간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따뜻함을 나눠 주어야 한다. 아주 가까이에서, 어디에서부터 서로가 분리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생[生]으로 차오른 록[綠]>에서 작가는 지금껏 곁을 내어준 초록을 한데 모아 자신의 바로 옆에 두기를 시도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초록은 나무 그 자체로서 작가를 위로했고, 춤을 추듯 바람에 살랑거리며 사랑을 노래하는 나무의 움직임으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으며, 나무가 되기 위해 단단한 땅의 시간을 견디며 때를 기다리는 씨앗의 용기를 전해주었다. 연두와 청록, 올리브와 라임 등 다양한 초록이 흐릿한 경계를 두고 여기에 모였다. 그리고 작가는 그 초록의 품에 온전히 안겨 있다. 하얀 눈이 녹고 완연한 봄이 오는 날, 이 나무에는 어떤 초록이 돋아날까? 지금 이 순간, 내 옆의 초록들을 한껏 들이마시며 기울어지며 상상해 본다.
-
[1]본 서문은 2024년에 열렸던 호크마김의 또 다른 전시 《From the Shack, New Sprouts Come.》을 위해 작성했던 서문 <기억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와 지금 내 뒤의 고스란한 나무는 어떻게 포개지는가>를 마무리 지으며 이야기했던 현관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이어진다.
[2]이번 전시의 작품들 속에서 작가를 상징하며 등장하는, 기울어진 채 여러 기둥이 모인 나무 형상의 기원이 된 실제 나무 사진을 보며, 바람에 휘어진 나무는 어떻게 성장하며 자신의 방향을 인지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의 문의란에 이에 대한 질문을 남겼고, 받은 답변을 위에 요약하여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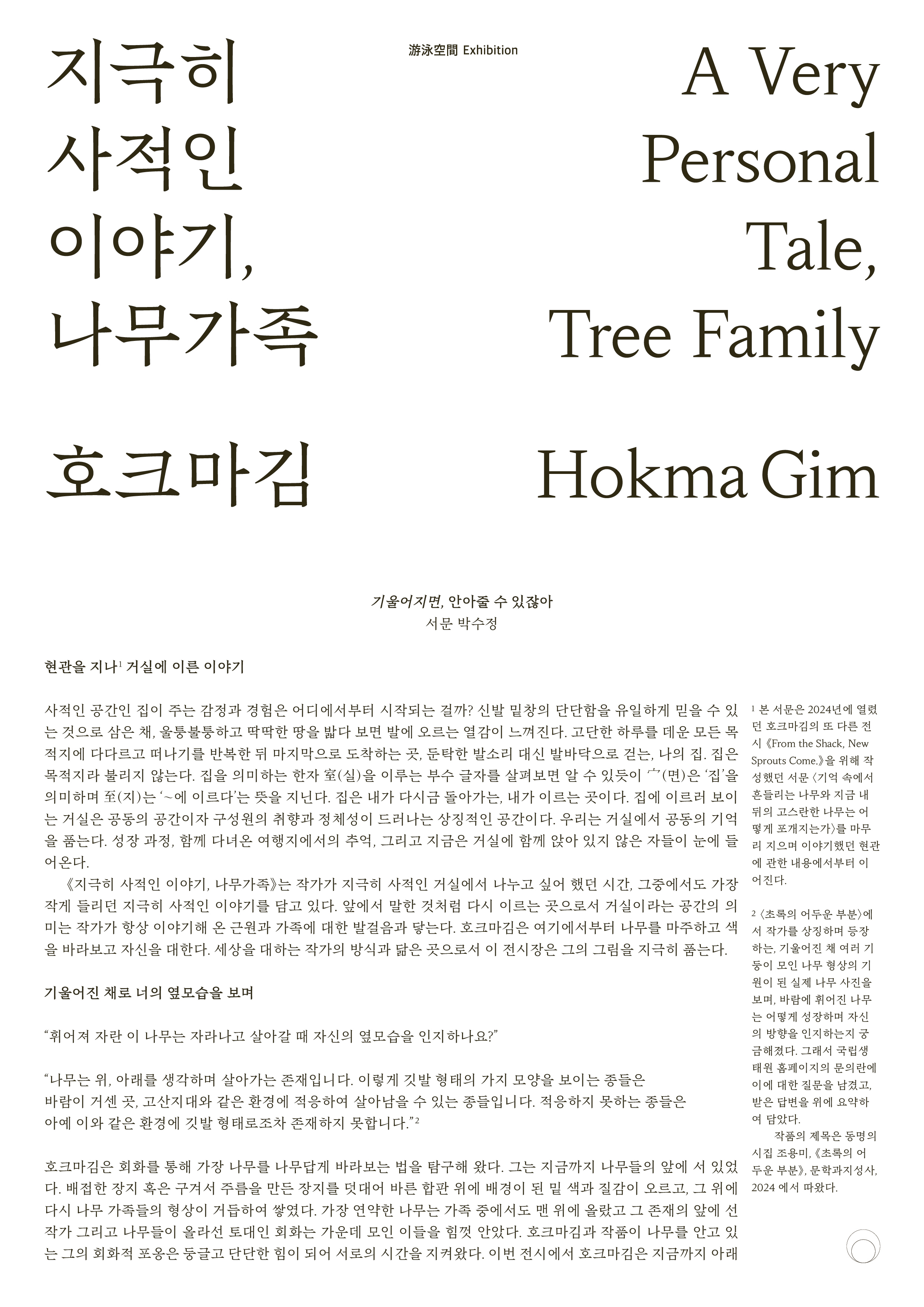

전시 서문 자료
